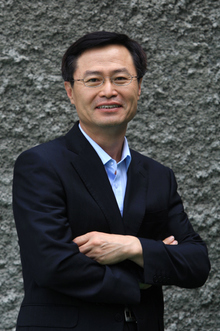| [아침햇발] 골목대장에 맞선 시민들 / 정영무 | |
 |
정영무 기자 |
신문사는 독자에게 신문을 팔고 광고주에겐 지면을 팔아 수익을 올린다. 신문 판매와 광고 판매는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광고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독립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고 비중이 80~90%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높다.
광고시장에서는 발행 부수라는 물량 기준이 압도한다. 그런 까닭에 신문사는 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 기를 쓴다. 발행 부수를 근거로 지면의 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중앙일간지는 매출이 크건 작건 대체로 ‘발행 부수 1부=연간 광고수익 20만원’이란 공식을 적용받는다. 공짜 신문, 상품권 신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러한 시장 질서는 조·중·동이 주도한다. 물량 경쟁은 자본력 싸움이다. 판매 시장뿐 아니라, 광고 시장도 이처럼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않다. 가치 상품인 신문이 발행 부수에 의해서만 공정가가 매겨지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
조·중·동은 또한 광고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린다. 예컨대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낸 광고주에 대해 <한겨레>가 취할 수 있는 방도는 없다. 그렇지만, 어느 기업이 대학생층 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겨레에만 광고를 냈다면 조선일보의 깐깐한 점검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중·동은 광고주와 다른 신문에 대해 골목대장 행세를 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이 신문들이 ‘탄압’을 받고도 건재할 수 있었던 바탕이다. 보도 내용으로 비판을 받고 줄소송을 당해도 ‘1부당 20만원’의 시장 메커니즘은 되레 공고해졌다. 발행 부수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 적극적인 구독 권유로 떠받치면 됐다.
촛불은 시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광고 메커니즘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언론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화난 시민들은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행동으로 나섰다. 광고주 리스트를 만들어 전화를 하고 댓글을 다는 ‘오늘의 숙제’를 꼬박꼬박 하고 있다. 조·중·동 카르텔과 주요 광고주 사이의 이해에 불일치가 생기고 견고한 메커니즘에 금이 갔다. 기업들은 불매운동에 무척 민감하다. 광고비를 지출하고 욕까지 먹겠다는 기업은 없다. 어느 기업주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조·중·동에 누가 광고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광고를 예약했던 기업이 광고비는 줄 테니 광고를 싣지 말아 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중·동은 광고 매출이 뚝 떨어져 비상이 걸렸다. 거의 공황 상태다. 시민들의 조직적 행동이 계속되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어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기사 비판이나 독자 이탈은 불매운동의 직격탄에 견주면 양반이다. 시민 행동을 두고 법적 대응을 하기도 여의치 않다. 시민 행동주의는 거친 면도 있지만 광고주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시장의 질곡을 바로잡는 구실이 크다. 제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소비자 주권의 행사로 봐야 할 것이다.
시민 행동이 계절을 넘기며 지속한다면 언론 지형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광고 수익이 따라주지 않으면 비용 때문에 거품 부수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물량 경쟁은 의미가 퇴색한다. 신문이 차별화되고 질로 경쟁하는 기반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논조의 분화도 예상된다. 광고주들이 몸을 움츠려 신문사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수·물량 주도적 시장 구도가 시민들의 손끝에 허물어진다면 이는 커다란 언론개혁이다. 레닌은 아무리 강한 것에도 약한 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집단 지성이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공격하고 있다.
정영무 논설위원young@hani.co.kr
| ||||||||||
'WE > 또 하나의 기쁨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 프로야구] 백차승 6이닝 무실점 '시즌 2승' (0) | 2008.07.05 |
|---|---|
| [렌즈세상] 아내의 고구마 /이종훈 (0) | 2008.07.05 |
| [연구] 커피 예찬론 (0) | 2008.07.03 |
| [뉴스] 박인비, 달라진 위상에 '희희낙락' (0) | 2008.07.03 |
| [뉴스] NY타임스 박인비 우승 찬사 (0) | 2008.07.03 |